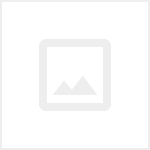진중권의 이매진 (진중권)
- 책 이야기 / 독서 노트
- 2009. 3. 12.
영화비평이 아닌 ‘담론의 놀이’로 출발한 이 책은 그래서 작가의 놀이터와 같은 철학과 미학의 영역에서 추출한 개념들을 다수 담고 있다. 이를테면 영화 <300>을 이야기 하며 발터 베냐민의 생각의 일부를 끌어오거나 <웨이킹 라이프>를 언급하면서 팝 아트와의 유사성을 이야기 하는 식이다. 그런가 하면 ‘미디어와 권력’으로 명명된 챕터에선 우리 현실이 이미 연출된 권력과 미디어로부터 탄생한 허구라는 보드리야르 철학을 영화 <JFK>에 얹어내고, 아홉 번째 챕터 속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주인공의 음반제작에 얽힌 에피소드는 베냐민과 아도르노의 복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와 함께 이야기된다.
이런 글의 형태는 영화의 기본적인 구조나 구성요소를 물고 늘어지며 ‘좋다’, ‘나쁘다’는 가치판단의 잣대로 ‘평가’하는 이른바 ‘비평’의 생김새와는 사뭇 다르다. 비평의 영역을 벗어나 특정 소재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라면, 영화 속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내리는 글이나, 예컨대 중세시대를 다룬 영화에서 그 배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글, 혹은 수많은 의상이 소요되는 영화 속 패션을 전문가의 눈을 통해 들여다보는 글들도 가능할 것이다. 이 책이 진중권의 ‘담론의 놀이’로 탄생한 것처럼 다양한 소재를 안은 글쓰기의 범위는 굉장히 방대해진다. 그리고 색다른 시선들이 가감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새롭고 재미있다.
문제는 <진중권의 이매진>을 비롯하여 이러한 글들을 읽는 재미는 굉장히 쏠쏠한데 반해, 정작 스스로 쓰기엔 어렵다는 것. 만약 관심사가 다양하고 그 깊이 또한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면 영화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글쓰기를 할 수 있을 테지만, 결국 글을 끼적거리는데 필요한 독특한 시각이나 상상력의 결여는 창의력과 능력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영화든 무엇이든 그 감상하는 대상이 던져주는 수많은 이야기 거리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서 여타 개념들과 결합하거나, 견주어 비틀거나, 상상도 못한 희한한 결론으로 설득력 있게 몰고 가는 게 가능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글쓴이의 능력이며 또 다른 창작행위다. 이 얼마나 부러운 능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