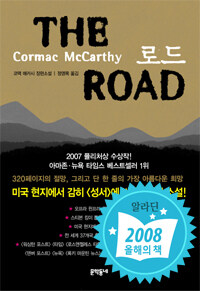로드 (코맥 매카시)
- 책 이야기/독서 노트
- 2009. 1. 18.
<로드>를 읽다 보면 ‘재’와 ‘잿빛’이라는 단어가 높은 빈도로 등장한다. 남자와 소년이 걷는 길은 온통 재로 뒤덮여 있고 물에 떠있는 것도, 바람에 날리는 것도 재, 멀리 보이는 건물들의 외양을 묘사할 수 있는 색깔도 오로지 잿빛뿐이다. 친절히 설명해주지 않아도 독자는 이 세계가 무언가 거대한 사건이 한 차례 휩쓸고 간 폐허와 동의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 이 무채색의 공간에서 남자와 소년은 무엇을 위한 생존인지도 모른 채 해변을 찾아 떠난다.
남자는 사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를 죽음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은 오로지 소년뿐이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세계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과거 이곳에서 인간들이 살았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발길을 옮기는 거리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과 살가죽을 발견할 때다. ‘삶의 터전’이라는 말이 사치가 되고 ‘식량’이 희귀단어가 되는 이 시간 안에, 살아있는 누군가와 마주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을 내포한다. 인간들은 급기야 생존 자체가 목적이 되어 서로를 뜯어먹는 동물이 된다. 남자도 소년이 없었다면 이런 동물이 되었을 것이다. 소년은 그를 아버지라 부른다.
말하자면 남자는 소년을 보호하고 소년은 남자를 살린다. 어떤 기막힌 사건도, 무슨 감격적인 순간도 보기 힘든 소설 <로드>를 계속 읽어 내려가게 하는 힘은 결국 서로를 이승의 세계에 잡아두는 그 힘을 이들이 잃게 되었는지 어쨌는지 그 끝이 궁금해서다.
한가지 더. 코맥 매카시는 그가 촘촘하게 그려내는 이 절망의 공간에서 두 사람이 살아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 생각해보게 한다는 것.
남자는 고민한다. 소년의 미래를 화사하게 물들일 장밋빛 물감 같은 것은 애초에 없었다. 그가 아들의 눈을 통해 시간을 건너 바라보는 색 또한 ‘잿빛’이다. 그렇다면 소년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더 이상 재가 둥둥 떠있는 물을 마실 필요도, 썩은 헝겊으로 동여맨 발로 길을 걷는 것도, 부풀어버린 통조림을 바라보며 식욕과 이성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그 세계로 함께 들어가버리는 것은.
그러나 남자는 한발 남은 총알을 끝내 사용하지 못한다. 구원도 신도 없는 이 잿빛 공간에서 살아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소년에겐 남자가, 남자에겐 소년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을 스스로 결정짓기엔 어려 보이는 소년에겐 마지막을 버텨줄 기둥 같은 아버지가, 과거의 기억과 현실의 괴리감 사이에서 혼돈하는 남자에겐 그 유일한 이음매가 될 소년이.
운이 좋아 살아남았던 이들은 이후 모두 짐승이 되었다. <로드>는 그 황량한 폐허에서 본능이 아닌 채로 생을 이어가는 남자와 소년을 유일한 인간으로 그리고 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너를 인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추억, 희망, 미래, 가족, 사랑, 재를 불어내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물, 부풀어오르지 않은 통조림…
전 지구를 뒤엎는 자연재해였든, 강대국의 뒤틀린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핵전쟁이었든, 이 세계가 이렇게 된 연유 따윈 이 책에 등장하지 않는다. 코맥 매카시는 그런 면에서 독자의 상상력을 열어 놓는다.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그려내는 남자의 주변과 그들의 행동은 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굉장히 냉담하게 드러내지만 그럼으로써 오히려 그 처절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절정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소설의 구조와 달리 <로드>는 두 사람의 길을 그저 따라갈 뿐이다. 그러다 마찬가지로 생존해있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위협이 되거나 그 반대가 되거나. 독자도 작가가 써 내려간 문장 하나 하나를 덤덤히 따라간다. 그러다 소설의 마지막을 마주하는 그때, 덧없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거나 ‘잿빛’으로 덧칠한 희망을 애써 끄집어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