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애거서 크리스티) - 추리소설을 읽는 즐거움
- 책 이야기/독서 노트
- 2008. 2. 9.
추리소설은 언제나 한가지 감상만을 낳는다. 그것은 독자가 등장인물 어디쯤을 방황하다 의혹의 눈길을 둬버린 용의자에 대한 기억이다. 말하자면 밝혀진 범인과 읽는 이가 찍어뒀던 용의자 사이의 차이만이 뚜렷이 남을 뿐이랄까. 그가 범인이었던가? 아니다, 그 사건은 그가 범인이었어. 근데 어떤 사연이 있던 살인사건이었지? 이렇게 추리소설은 우리가 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기억의 갈래 중 하나만을 남겨둔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여운에도 불구하고 추리소설은 재미있다. 인륜을 거스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미지의 범인을 향한 두근거림, 그리고 실제범인과 상상의 용의자가 일치할 때의 쾌감이 추리소설을 읽는 흥미를 돋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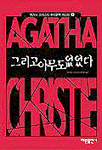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에는 각자의 어두운 사연을 간직한 10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누군가의 편지를 받고 인디언 섬의 저택에 찾아와달라는 메시지를 접한다. 오윈이라는 이름의 저택의 주인은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 있다. 이 기묘한 초대는 사실 누군가의 함정이었음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다. 섬에 찾아온 열 사람 중 한 사람씩 죽어가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이름의 저택 주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섬에서 육지로 갈 방도조차 안개 속에 희미하다. 열 명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음모로 섬에 갇혀버렸다. 이들은 살인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섬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와 맞닥뜨린 채 그 공포 속에서 죽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인가.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연극으로도 제작되었고 영화의 모티브로도 사용된 이 소설은 당연히 그 이유가 될 만큼 영화적인 구성에 어울려 보인다. 소설은 과도한 배경묘사나 복잡한 플롯의 교차 없이 불가사의한 살인과 점점 파헤쳐지는 등장인물들의 과거사를 향해 온전히 돌진한다. 이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2시간 안팎의 러닝타임에 더 없이 들어맞으며, 단순하고 이해가 빠르지만 줄곧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야기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추리소설을 읽는 기본적인 이유가 소설이 전해주는 긴장감과 호기심이라고 봤을 때, 캐릭터들의 과거를 펼쳐놓고 각자의 업보와 현재의 연쇄살인을 연결해 보라는 이 책의 주문은 적절하다. 독자는 이들 내부에 있을 어둠의 그림자를 색출하는 데 온 신경을 쓰다가도 과거의 사건들을 궁금해한다. 결국 독자는 범인이 밝혀짐과 동시에 으레 찾아올 허탈감을 맛보리라는 것을 알지만,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만은 흥미진진한 것이 추리소설의 묘미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 여전히 독자의 엉덩이를 들뜨게 만드는 힘이 있다.